애창시(100)
모란이 피기까지는(1935) 김영랑(1903 ~ 1950 )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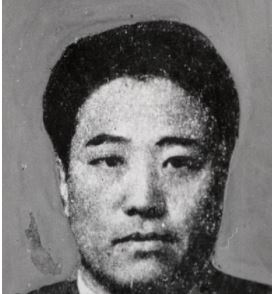
김영랑 시인
(약력)
1903년 1월 전라남도 강진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김영랑(金永郞, 1903.1.16~1950.9.29)의 본명은 윤식이다. 그는 강진보통학교를 나오고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로 상급학교 진학이 막힐 뻔하였으나 어렵사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1916년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영어를 익힌다. 1917년 휘문의숙(현재의 휘문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선배인 홍사용, 안석주, 박종화와 후배로 들어온 정지용, 이태준 등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며 학창시절을 보낸다. 1919년 3·1운동 당시 열여섯 살이던 그는 구두 속에 선언문을 감추고 고향 강진으로 내려갔다가 거사 직전에 발각되어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 결국 재학 중이던 휘문의숙을 졸업하지 못한 채 1920년 일본으로 가서 아오야마학원(현재 아오야마 가쿠인대학) 중등부에 입학한다.
이 무렵 김영랑은 평생 우정을 나누게 되는 박용철을 만난다. 박용철은 그에게 시를 쓸 것을 권유한다. 중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는 등 음악에 남달리 관심 많던 그는 도쿄에서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으나, 음악 공부를 하면 절대로 학비를 대줄 수 없다는 아버지 때문에 영문과로 적을 옮긴다. 그러나 이 또한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중도에서 포기하고 만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을 오가며 작가 최승일과 교유하게 된다. 최승일의 집을 드나들던 그는 숙명여고에 다니던 최승일의 누이동생이자 해방 후 월북한 당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와 사귀며 문단에 염문을 뿌린다.
1930년 3월 김영랑은 <시문학> 창간호에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후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로 제목이 바뀜)’, ‘언덕에 바로 누워’, ‘4행 소곡 7수’ 같은 시편을 발표함으로써 정식으로 등단한다. 신진 시인 김영랑은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던 문단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로 빛을 발한다.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시가 지닌 매력과 독자성에서 말미암지만, <시문학> 발간을 주도한 친구 박용철의 도움도 적지 않다.
박용철은 일찍이 김영랑의 시적인 자질을 간파해 유학시절부터 시 쓰기를 권유하고, <시문학>을 발간하는 동안 꾸준히 김영랑의 시를 부각시킨다. 박용철은 김영랑의 시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몹시 아끼고 사랑했다. 이러한 사실은 박용철이 자신의 시집은 내지 않으면서도 1935년 11월 <시문학사>에서 [영랑시집]을 펴낸 것으로도 입증된다.
김영랑의 생애는 대체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김영랑의 작품 속에 알게 모르게 시대의 암울한 그림자가 깃들여 있으리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그의 시 세계에서는 흔히 경험의 구체적 상(像)들이 생략된 채 막연한 슬픔과 한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김영랑의 시 세계를 뒤덮는 슬픔과 한, 상실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계기를 봉쇄한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의 억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증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이 시를 김영랑은 나이 서른 살을 갓 넘긴 무렵에 썼다.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나의 꿈과 그 시간의 보람,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설움과 불모성을 함께 노래했다. 이 시는 찬란한 광채의 ‘절정에 달한‘ 시간을 포착하듯 짧게 처리하면서 음울과 부재의 시간을 길고도 지속적으로 할애하는 데 시적 묘미가 있어 보인다. 시인은 낙화 후의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떨어져 누운 꽃잎‘의 시듦뿐만 아니라, 시듦 이후의 건조와 아주 사라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한 데에는 모란이 피는 희귀한 일의 극명(克明)한 황홀을 강조하기 위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 시는 감미로운 언어의 울림을 살려내는 난숙함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고, ‘눈물 속 빛나는 보람과 웃음 속 어둔 슬픔‘을 특별하게 읽어낼 줄 알았던 영랑의 유다른 안목과 영리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시가 사람이라면 그이는 무엇을 간곡하게 바라며 뛰는 가슴인가. 많은 시들이 울분과 슬픔의 감정을 표표하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 찬란한 쪽으로 몰아쳐 가기를 바라는 열망에 기초해 있다. 한편 한편의 시는 그런 마음의 예감과 기미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아무리 작은 것을 노래해도 이미 뜨겁고 거대하다.
(마감 소감 작성하기)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랑 [金永郞] – 한국어의 시적 아름다움에 헌신한 시인 (나는 문학이다, 2009. 9. 9., 나무이야기)
―일간『한국 현대시 100년 시인 100명이 추천한 애송시 100편 100』(조선일보 연재, 2008)
(『영랑시집』.시문학사. 1935 :『김영랑 전집』.문학세계사. 1981)
―최동호 신범순 정과리 이광호 엮음『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문학과지성사,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