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창시(97)
맨발(2004) 문태준(1970 ~ )
어물전 개조개 한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
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
고 슬픔을 견디었을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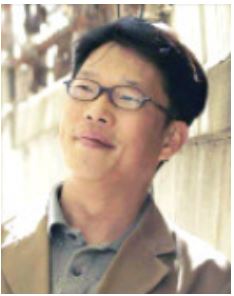
(약력)
경상북도 김천이 고향,
소속불교방송 (프로듀서)
데뷔1994년 문예중앙 등단
1996 ~ 불교방송 프로듀서
시동인 ‘시힘‘ 동인
(해설)
문태준(38) 시인의 시에서는 뜨듯한 여물 냄새가 난다. 느림보 소가 뱃속에 든 구수한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투실한 입모양이 떠오른다. 잘 먹었노라고 낮고 길고 느리게 음매– 울 것도 같다. 21세기 벽두의 우리 시단에서 그의 시는 ‘오래된 미래‘다. 찬란한 ‘극빈(極貧)’과 ‘수런거리는 뒤란‘을 간직한 청정보호구역이다. ‘시인·평론가가 선정한 2003년 최고의 시‘로 뽑히기도 했던 이 시는 겹겹의 배경을 거느리고 있다. 수묵의 농담(濃淡)처럼 그 그림자가 자연스럽다. 죽기 직전의 개조개가 삐죽 내밀고 있는 맨살에서, 죽은 부처의 맨발을 떠올리는 상상력의 음역은 웅숭깊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 아버지의 맨발, 그 부르튼 한평생을 얘기하고 있다. 시를 포착하는 시적 예지와 시안(詩眼)의 번뜩임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세상에 제일 나중에 나와,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하중을 견뎌내고서는, 세상으로부터 제일 나중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맨발이다. 맨발로 살다 맨발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평속(平俗)한 세파를 화엄적으로 견뎌내는 존재들이다. 길 위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길 없는 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다 길 위에서 열반에 든 부처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섭을 위해 관 밖으로 내밀어 보여준 두 발에는 천 개의 바퀴살을 하나로 연결시킨 바퀴테와 바퀴통의 형상이 새겨있었다고 한다. 부처는 무량겁 지혜의 형상을,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제자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바깥‘에서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이 맨발의 움직임은 적막하다. 어물전의 개조개가 무방비로 내놓았다가,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맨발을 거두어들이는 그 느린 속도에는 죽음이 묻어 있다. 무언가를 잃고 자신의 초라한 움막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맨발‘의, 적나라한, 온 궁리를 다한 뒤끝의 거둠이다. 탁발승의 벌거벗은 적멸이요, 개조개 속에 담긴 부처다. ‘조문‘하듯 만져주는 시인의 손길 또한 애잔하다. 개조개가 슬쩍 내보인 맨발에서 천길 바다 밑을 걷고 또 걸었던 성스러운 걸인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한 우리의 아버지들과, 그 범속(凡俗)한 빈궁 속에서 세계의 아득한 끝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차디찬 맨발을 만져본 사람에게 이 시의 적막함은 유난하다.
인연이든 시간이든 기적이든 순력(巡歷)을 다했기에 ‘바깥‘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부르튼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기에, ‘아-‘ 하고 우는 것들을 채워주었기에, 느리고 느리게 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 다시 생각해도/ 나는/ 너무 먼/ 바깥까지 왔다“(〈바깥〉)!
(참고자료)
–일간『한국 현대시 100년 시인 100명이 추천한 애송시 100편 97』(조선일보 연재, 2008)
(『맨발』.창비. 2004)
―최동호 신범순 정과리 이광호 엮음『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문학과지성사,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