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창시(76)
조국(祖國)(1962) 정완영 (1919 ~ 2016)
행여나 다칠세라 너를 안고 줄 고르면
떨리는 열 손가락 마디마디 에인 사랑
손 닿자 애절히 우는 서러운 내 가얏고여.둥기둥 줄이 울면 초가 삼간 달이 뜨고
흐느껴 목메이면 꽃잎도 떨리는데
푸른 물 흐르는 정에 눈물 비친 흰 옷자락.통곡도 다 못하여 하늘은 멍들어도
피 맺힌 열두 줄은 굽이굽이 애정인데
청산아, 왜 말이 없어 학처럼만 여위느냐.

(시인 정완영)
1960년 『국제신보』 신춘문예에 시조 「해바라기」가 당선되고, 1960년부터 『현대문학』을 통해 「애모」(1960), 「어제 오늘」(1961), 「강」(1962) 등이 추천되었으며,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조국」이 당선되었다. 이후 「채춘보(採春譜)」(1966), 「산이 나를 따라와서」(1969), 「수수편편(首首片片)」(1969, 1971, 1979), 「초겨울 설악에 와서」(1988) 등을 발표했다. 『낙강』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시조집 『채춘보』(1969), 『묵로도(墨路圖)』(1972), 『실일(失日)의 명(銘)』(1974) 등을 발간했다.
그의 시는 「조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시적 소재를 통해 한국적인 한의 세계를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승화시켜 표출하거나, 전통적인 서정에 바탕을 둔 자연관조의 세계를 시화했다. 이는 “조국, 그것은 내 구원의 사랑이었기에 이 가슴의 병이었고, 인연, 이도 내 받고 온 오랏줄이라서 핏줄처럼 당기어 아파 오는 것일까?”(『묵로도』 서문)라는 시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작품집으로 『채춘보』(1969), 『묵로도』(1972), 『실일의 명』(1974), 『연과 바람』(1984), 『난보다 푸른 돌』(1990), 『오동잎 그늘에 서서』(1994), 『엄마 목소리』(1998), 『이승의 등불』(2001) 등이 있다.
(경력사항)
낙강 동인 활동
(수상내역)
1960년 작품명 ‘해바라기‘ – 국제신보 신춘문예에 시조 「해바라기」가 당선
1962년 작품명 ‘조국‘ –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조국」 당선
(작품목록)
채춘보, 묵로도, 실일의 명, 연과 바람, 난보다 푸른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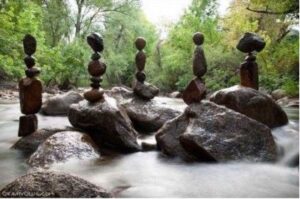
(해설)
<1962년> 정완영(89) 시인은 평생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만을 위해 외길 인생을 살아왔다. 우리는 정완영 시인을 통해 “이 당대, 시조 분야의 숭고한 순교자적 상(像)”(박경용)을 만난다. 시조를 말할 때 가람 이병기와 노산(鷺山) 이은상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초정(草汀) 김상옥, 이호우를 말하고, 그 뒤에 백수(白水) 정완영을 세워 말한다. “백랑도천(白浪滔天) 같은 분노도 산진수회처(山盡水廻處)의 석간수 같은 설움도 시조 3장에 다 담으셨다.”(조오현)
박재삼 시인은 정완영 시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숭앙해서 “조용하게 잘 참는 것이 있다”면서 “야단스럽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이 그를 시조의 거목이게 했다”고 썼다. 이 시조는 196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정완영 시인의 초기 작품이다. 조국의 슬픈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배어 있다. 시 〈만경평야에 와서>에서 “애흡다 열루(熱淚)의 땅 내 조국은 날 울리고”라고 썼을 때처럼. 조국을 한 채의 전통악기 가얏고(가야금)에 빗대면서 조국에 대한 큰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옛 시조의 행 배열을 살리면서 시종 장중한 어조로 감칠맛 나는 고유어를 사용했다. 청각에 시각을 한데 버무리는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은 압권이다. 가얏고의 서러운 가락이 귀에 들리는 듯하고,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청사(靑史)를 보는 듯하고, 한 마리 학의 고고한 성품을 가슴으로 마주하는 것 같다.
정완영 시인의 시조는 천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사와 우주적인 상상력을 자랑한다. “내가 입김을 불어 유리창을 닦아내면/ 새 한 마리 날아가며 하늘을 닦아낸다/ 내일은 목련꽃 찾아와 구름 빛도 닦으리.”(〈초봄〉)같은 시조를 보라. 무릎을 치며 저절로 감탄할밖에.
이뿐만 아니라 정완영 시인은 정겨운 동시조도 많이 써왔다. 〈분이네 살구나무〉는 대표적이다. “동네서 젤 작은 집/ 분이네 오막살이/ 동네서 젤 큰 나무/ 분이네 살구나무/ 밤사이 활짝 펴올라/ 대궐보다 덩그렇다.”
“시조는 말로만 쓰는 시가 아니라 말과 말의 행간(行間)에 침묵을 더 많이 심어두는 시”라고 말하는 그는 요즘도 매일 간곡하게 시조를 창작한다. 원로 시조시인의 이 창창(滄滄)한 뜻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정완영 [鄭椀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2. 25.)
-일간『한국 현대시 100년 시인 100명이 추천한 애송시 100/76』(조선일보 연재, 2008)
편집인(편집부2000hansol@hanmail.net)

